박영란 - 독일 역사 도시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작성일 :
2019.09.30
조회수 :
1016
독일 역사 도시
박영란
개인에게도 멍에가 있다면 한 나라 한 민족에도 멍에가 있지 않을까. ‘구속이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독일은 분명 그렇다.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오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이런 사실들은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독일에게서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다. 이런 과거들이 언제나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듯, 사람들의 잠재의식 또한 그러한 사실에 갇혀 있는지 모른다.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쉰들러 리스트’…이런 영화들이 주는 그 강렬한 내용과 이미지들이 독일을 대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15~19세기에 이룩한 독일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현재 독일의 모습에 대해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일간(12일의 테마세이투어와 8일의 자유여행)의 독일 여행은 벅찼다. 볼 것들이, 보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 알고 보아야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도시들은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며 역사의 현장들이었다. 미처 예견치 못한 자연을 만날 때처럼, 이들이 가진 유산과 그것을 그들의 방식대로 지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이면과 그 차이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착잡했다. 독일여행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감정들이 따라다녔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인해.
공부하듯 여행했던 독일여행. 그 여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여행가방을 계속 펼쳐놓은 듯한, 의식의 한부분이 열려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이미지들이 확연하게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멋진 풍광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묵직한 느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여행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끝나도 좋지만, 자꾸 ‘되새김’되는 여행도 좋다. 누군 그것이 진짜여행이라고 했던가.
뭔가 맴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라디오에서 ‘베를린 필하모니’라는 소리만 들려도, 책장에 꽂힌 ‘괴테’ 책이름만 보아도, 오늘같이 ‘콜비츠’의 신문기사만 봐도, 독일은 나만의 배경이 되어버린다.
이른 새벽 혼자 걸었던 드레스덴의 텅 빈 광장은 전날 그 많은 인파들이 사라지고 고요와 정적 속에서 비로소 다시 보이던 그 멋진 건물들. 바이마르에서 본 괴테의 흔적들. ‘국립 회화관’을 채우고 있었던 그 어머어마한 그림들. 과거 ‘한자동맹’ 도시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움과 부가 그대로 남아있던 브레멘과 뤼벡, 음악과 바흐의 도시 라이프니치.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고풍스런 성지 비텐베르크. 베를린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 그리고 이 도시들을 이어주었던 숲과 구릉과 나무와 그 맑은 하늘은 내 머리와 가슴에 자리 잡은 영상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여행의 가장 큰 후유증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낯선 땅에서 전해진 그 땅의 체온과 역사와 문화가 설핏 다가와 즐거운 통증으로 남는 것. 그래서 나는 또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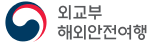
 테마세이 대표번호
테마세이 대표번호 여행 문의하기
여행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