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관적인 콜롬비아 여행기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작성일 :
2020.02.06
조회수 :
1033

작년 늦은 가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초청으로 콜롬비아 자연관광박람회에 참가했다. 전 세계 약 70개의 여행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겸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컨셉의 팸투어 중에서 난이도는 중하, 야생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적절히 조화된, 나름 콜롬비아의 테마세이투어 같은 맞춤 여행사의 여행을 선택했다.
회사를 대표해서 매의 눈으로 콜롬비아를 평가하겠다는 의욕과,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총 19시간의 비행을 거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도착하고 나니 새벽 1시. 해발고도 2,640m에 위치한 고원 도시여서 그랬는지, 호텔을 찾아 으슥한 골목길을 하염없이 달리는 택시 때문이었는지 심장이 꽤 두근거렸다.
다음날 국내선을 타고 요팔(Yopal)로 이동했다. 지프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원시 자연 안의 럭셔리 롯지, Corocora Camp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야생의 한복판이었다. 밤에는 퓨마와 재규어가 돌아다니고, 캠프 뒤편 작은 강에는 악어, 피라냐, 뱀 들이 살고 있으니 꼭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캠프 주변으로만 다녀야한다는 당부에 등골이 오싹했다. 칠흑 같은 밤, 금방이라도 텐트를 무너뜨리고 들어올 것 같은 동물들의 인기척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 본격적으로 콜롬비아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소몰이, 자연보호활동, 커피 테이스팅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 땀은 줄줄 흐르고 몸에서 쉰내가 나기 시작했다. 새와 동물 관찰을 위해 사파리 차를 타고 기세 좋게 나섰다가 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걸어서 사바나를 헤매다가 숙소로 귀환하고 나니 이제는 원시고 자연이고 나발이고 빨리 도시로 가고 싶단 마음이 간절했다.

드디어 도시로 향하는 날. 새벽 4시에 기상해 지프차로 3시간을 달려 요팔 공항에 도착, 다시 비행기를 타고 중북부에 위치한 부카라망가로 이동, 다시 승합차에 실려 구불구불 산을 넘고 3시간을 달려 콜롬비아에서 가장 예쁘다는 마을 바리차라(Barichara)에 도착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오래된 마을, 희고 파란 아기자기한 집들, 평화로운 공기, 아름다운 전망과 골목마다 풍기는 커피향까지… , 바리차라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좋아할만한 곳이었다.
바리차라와 이웃 마을 구아네를 잇는 오래된 옛 길 ‘카미노 레알’에도 도전해보았다. 느릿느릿 걷는 2시간 동안 파란 하늘과 커다랗고 하얀 구름, 간간히 새소리만 들리는 정적, 정수리를 태울 듯한 태양만 존재하는 그런 길이었다.
한가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만한 마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팸투어가 끝나고 이틀 내내 콜롬비아 현지 여행사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콜롬비아는 사실 잘 알려진 커피 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려 1,950종의 다양한 새를 보유한 Bird Watching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윤무부 박사도 아니고 새 관찰이 무어냐며 아무 관심 없던 나조차도 지척에서 발견되는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뽐내는 새들을 보며 조금씩 흥분이 되기 시작했었다.
그밖에 보고타의 보테라 미술관과 소금성당, 열정적인 살사의 도시 칼리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해변도시 카르타헤나, 키 큰 팜트리 계곡, 커피 농장 등 콜롬비아는 컬러풀한 매력이 가득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할 시간. 과연 우리가 콜롬비아 여행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큰 한방이 없었다. 아기자기한 여행지는 많지만 우리끼리 흔히 말하는 소위 ‘악 소리’나는 곳이 부족했다. 아직 불안한 치안도 콜롬비아 단독 상품은 어렵다는 판단에 한몫했다.
하지만 언젠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묶는 여행상품 만들 때를 대비해 여행 자료는 충분히 챙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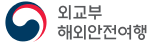
 테마세이 대표번호
테마세이 대표번호 여행 문의하기
여행 문의하기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