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여행자 간에는 여행 출발전에 여행계약서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행계약서라는 것이 참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사용호텔 이름이나 식사메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호텔은 몇 박을 제공하는지, 식사는 몇 끼가 포함되는지, 비행기를 타는가 기차를 버스를 타는가 등등 기본적인 틀만을 명시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계약서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치 식사를 주문하는데 숟가락의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것처럼…
 여행계약서의 근본취지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행사의 책임회피성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일정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못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정에 없는 것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때론 강매(强賣)되기도 한다.
여행계약서의 근본취지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행사의 책임회피성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일정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못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정에 없는 것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때론 강매(强賣)되기도 한다.
이는 “계약서대로만 하겠다”라는 매우 합리적인 태도이긴 하나 어딘지 개운치 않는 여운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여행사는 공산품을 파는 곳이 아니다. 문화를 파는 곳이다. 그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행위를 한 장의 계약서에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여행이라는 것이 가전제품 조립하듯이 모든 부품들을 껴맞추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행계약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여행은 '무난한 여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감동적인 여행'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기본일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다. 기본 일정에 충실하되 여행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다.
테마세이투어는 종이에 나열한 뻔한 내용들을 여행계약서라고 제시하고 싶지 않다. 우리들의 여행계약서는 그동안 축적해온 '신뢰감'이다. 신용보다 더 확실한 계약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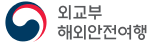
 테마세이 대표번호
테마세이 대표번호 여행 문의하기
여행 문의하기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