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창 - 청해성과 내몽고
작성자 :
테마세이투어
작성일 :
2015.05.13
조회수 :
1662
| 이 글은 서울에 사시는 강수창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강수창님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테마세이투어와 함께 청해성과 내몽고 여행을 다녀 오셨습니다. 글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에 내몽골의 바단지린(巴丹吉林) 사막을 여행했다. 바단지린 사막은 내몽골 자치구인 아리산유기의 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이 4만 7천㎢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막으로 불려진다. 그 사막여행의 출발은 장예에서 시작한다. 장예는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장예에서 바단지린 사막의 입구인 내몽골 아리산유기까지는 약 150km, 관광버스를 타면 세 시간 남짓 걸린다. 내 머리 속에 박혀있는 사막은 다소 피상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 피부가 벌겋게 익은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모래 언덕, 시간이 멈춘 듯 느릿느릿 걷는 낙타 행렬, 어쩌다 나타나는 오아시스. 이런 막막한 풍경이 내가 생각한 사막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바단지린 사막은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평균 기온은 25℃ 미만이었고 우리가 도착한 날에는 가랑비가 붉은 사막 모래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뜨거운 사막 열기를 식혀주는 고마운 가랑비를 맞으며 3인 1조가 되어 지프차에 올랐다. 지프차는 사막을 줄기차게 달려 나갔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지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졌다. 바람이 이루어 낸 크고 작은 모래 언덕이 각양각색의 굴곡을 펼치고 있었다. 사막의 곡선은 8등신 나신보다 아름다웠다. 피카소의 필체라도 자연이 이루어낸 오묘한 사막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리라. 뜨거운 사막 열기를 식혀주는 고마운 가랑비를 맞으며 3인 1조가 되어 지프차에 올랐다. 지프차는 사막을 줄기차게 달려 나갔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지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졌다. 바람이 이루어 낸 크고 작은 모래 언덕이 각양각색의 굴곡을 펼치고 있었다. 사막의 곡선은 8등신 나신보다 아름다웠다. 피카소의 필체라도 자연이 이루어낸 오묘한 사막의 형상을 만들 수 없으리라. 모래 언덕을 넘을 때마다 푸르른 나무와 풀로 둘러싸인 크고 작은 호수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절경을 이루는 호수가 100여 개가 넘었다. 지프차의 강렬한 엔진 소리와 일행이 내지르는 경탄의 비명은 그칠 줄을 몰랐다. 게다가 따가운 사막 햇빛 사이에 얼굴로 날라드는 가랑비도 색다른 선물이었다. 예상한 것과 현지 사정이 다를 때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의 덤이랄까. 차에서 내려 맨발로 밟아보는 모래의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맨땅을 맨발로 달리던 어린 시절이 아스라하게 되살아났다. 일행도 모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모래에 발목이 빠져 허우적거려도 마냥 웃기만 했다. 우스꽝스러운 서로의 모습에 터져 나오는 웃음은 불순물 하나 없는 햇살만큼 맑기만 했다. 모래 언덕을 걸어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발을 옮길 때마다 더 깊이 발목이 빠져들었다. 모래 능선에 걸터앉아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나도 그만 구릉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아래에 있던 일행들이 내 몸을 받쳐주었다. 세상 어디서든 혼자 살 수 없다는 이치를 새삼 확인하는 여정이 한동안 이어졌다. 높다란 어느 모래 언덕에 멈추었다. 불시에 펼쳐진 파란 호수를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호수 저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환영처럼 달려왔다. 마티즈 종류의 강아지는 우리 앞에 멈추더니 모래바닥에 뒹굴면서 꼬리를 흔들어댔다. 낯선 여행객이 무척 반가운 모양이었다. 건네준 먹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사람들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00여 호수 중에서 30여 호수에만 한 가구씩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 강아지조차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말 못하는 짐승도 무엇인가 그리워한다는 애틋함에 마냥 숙연해졌다. 잠시 일행을 벗어나 길도 없고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사막을 한동안 가로질러 갔다. 비로소 사막이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왔다. 내가 사막의 품에 안겼다. 문득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Shifting Sands)』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며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라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을 여행하려면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한다.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지 후회되기도 한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고단한 걸음과 따가운 등짝만이 있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만끽하거나 짜릿한 행복감이 밀려오기도 한다. 스티브 도나휴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사막 여행과 다를 게 없다. 목마른 걸음 후에 오아시스에 다달아 들이켜는 물맛은 더욱 달고 시원하다. 힘든 고비를 일단 넘어서면 견뎌낸 만큼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내 목적지 청해사 민박집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자마자 우물로 달려가 펌프 물로 모래를 씻어냈다. 피부에 달라붙은 사막 모래와 먼지가 왠지 낯설지가 않다. 어쩌면 그것들은 오래 전에 살았던 인간의 몸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빛에 비친 내 몸도 어느덧 사막의 주황빛을 되쏘고 있었다. 숙소는 기대했던 몽골식 겔이 아니라 벽돌로 지은 간이 막사였다. 잠자리도 합판을 붙여 만든 침대가 고작이었지만 내 육신을 아늑하게 받쳐주었다. 사막의 모랫바닥으로 자꾸만 빠져들었던 것처럼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사막을 걷고 달리고 있다. 몽롱한 의식에서도 사막을 걸었다는 사념을 끝없이 펼쳐낸다. 안개비가 자오록이 쏟아지던 새벽 들길을 걸은 적이 있다. 되돌아보면 뒤따라오던 발자국이 눈발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다.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사막을 걷고 달리고 있다. 몽롱한 의식에서도 사막을 걸었다는 사념을 끝없이 펼쳐낸다. 안개비가 자오록이 쏟아지던 새벽 들길을 걸은 적이 있다. 되돌아보면 뒤따라오던 발자국이 눈발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다. 그렇다. 오늘 하루 바단지린 사막에 점점이 찍힌 내 발자국도 한 줄기 바람에 지워지곤 했다. 지워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앞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온 내 삶의 궤적과 너무나 흡사하게 보였다. 지나고 나면 걸어온 발자국뿐만 아니라 누워서 쫓는 망상조차 모두가 지워지는 부질없는 것. 내일 아침에 나는 바단지린의 붉은 사막을 계속 여행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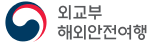
 테마세이 대표번호
테마세이 대표번호 여행 문의하기
여행 문의하기
 TOP
TOP